담임목사 칼럼
 >
>
- 커뮤니티 >
- 담임목사 칼럼
| 안락사 | 최철광 | 2022-12-18 | |||
|
|||||
|
안락사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의 작가 신아연씨는 지난해 8월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호주 교민 A씨의 스위스 여행 동행자 9명 중 한 명이다. 스위스 조력사 단체 ‘페가소스’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무리 짓기 위한 여행이었다. 당시 A씨는 64세로 폐암 말기 환자였다. 가족·친지도 아닌 신씨가 이 여행에 동행한 건 A씨가 자신의 마지막을 기록해달라며 그를 초대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호주 교민신문 기자 출신인 신씨의 20년 독자였다.
신씨는 당시 순간과 A씨의 표정, 일행의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한다. “밸브를 돌린 지 8초가 지나자 A씨 얼굴이 탁하고 꺾였습니다. 일행 모두 죄인처럼 앉아있었어요.” 안락사 후 A씨 유해는 국내 한 수목장에 묻혔다. A씨가 안락사를 택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신씨는 ‘외롭지 않았다면, 외국을 떠돌며 뿌리 없이 살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란 A씨의 말이 떠오른다. 신씨는 “유족 중 특히 부인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전했다.
신씨는 이 일을 계기로 ‘안락사 반대론자’가 됐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그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로 병원에 돈을 쓰기보단 좋아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죽음을 택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나니, 그분을 더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요. 안락사 찬성론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안락사는 선진적 제도고, 한국의 안락사 합법화도 시간문제다. 나는 선구자로 남고자 한다’는 고인의 뜻을 따라 펜을 들었지만, 기록은 그 정반대로 쓰였다. 안락사를 목격한 뒤 신씨가 겪은 변화는 또 있다. 동양철학에 심취한 유물론자이자 무신론자였던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A씨와 마지막에 나눈 대화가 계기가 됐다. “‘나 그만 갈게요’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고인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물으니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영면했습니다. ‘조금 전 멀쩡히 인사말을 한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란 질문이 그때부터 5개월여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개월 간 고민 끝에 그는 기독교에서 답을 찾았다. 영혼의 존재, 천국 등 내세뿐 아니라, 신앙 없이 오갔던 호주 이민교회 생활 중 들었던 ‘부활’ ‘구원’ ‘영생’ 등 기독교 핵심 교리도 믿게 됐다.
안락사는 본인의 생명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낙태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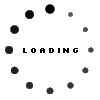
댓글 0